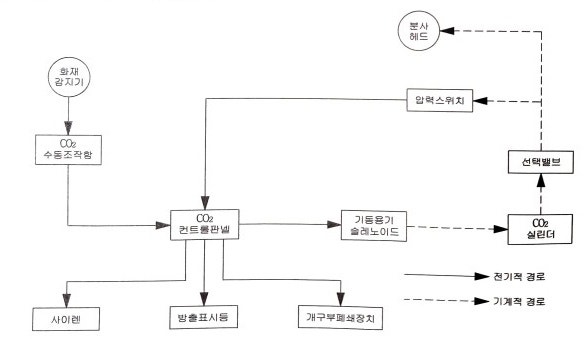부어도 부어도 차지 않는 술잔이여! 유배 생활을 했던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말벗은 주변의 사물뿐이었다.
그림은 18세기 단원 김홍도의 ‘포의풍류도(布衣風流圖)’. 동아일보 자료 사진 부엌과 방 구분도 없는 작은 집은 높은 울타리로 둘러싸였다.
그 위로 가시나무가 덧대어 있다. 햇볕이 안 들어 대낮인데도 황혼 같다.
음식이 들어오는 울타리 남쪽 작은 구멍이 세상과의 유일한 통로다. 유배지는 무덤이나 다름없었다. 1519년 11월 15일 기묘사화가 있던 날, 정4품 홍문관 응교(應敎)였던 저자 기준(1492∼1521)은 숙직 중에 영문도 모른 채 의금부로 끌려갔다.
조광조(1482∼1519) 등 신진 사류들과 교유했다는 것이 죄목이었다. 그는 27세의 나이에 함경도 온성에 유배됐다.
그가 유배지에서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의 베게. 이불, 술잔, 창문.
울타리, 젓가락뿐이었다. 그는 60개의 ‘말 못하는 친구에게 각각 이름을 붙이고 자신의 생각을 더해 ‘육십명서(六十銘序)’라는 책을 ...
원문링크 : 부어도 부어도 차지 않는 술잔이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