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새해의 몇 날이 지났어요. 해마다 새해를 맞이하며 다시 일어나 살아가는 우리 인생 아침에 배현봉 시인의 시집에 실린 시 중 '육탁', '아침'을 필사하며 아침 인사를 나눕니다.
어둠후에 빛이오고 바닥을 친 후에 일어나 솟아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. 쉽지 않은 저마다의 삶 속에 그대도 삶이 소중함을 기억하면서.
육탁 배한봉 새벽 어판장 어선에서 막 쏟아낸 고기들이 파닥파닥 바닥을 치고 있다. 육탁(肉鐸) 같다.
더 이상 칠 것 없어도 결코 치고 싶지 않은 생의 바닥 생애에서 제일 센 힘은 바닥을 칠 때 나온다. 나도 한때 바닥을 친 뒤 바닥보다 더 깊고 어둔 바닥을 만난 적이 있다.
육탁을 치는 힘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바닥 치면서 알았다. 도다리 광어 우럭들도 바다가 다 제 세상이었던 때 있었을 것이다.
내가 무덤 속 같은 검은 비닐봉지의 입을 열자 고기 눈 속으로 어판장 알전구 빛이 심해처럼 캄캄하게 스며들었다. 아직도 바다 냄새 싱싱한, 공포 앞에서도 아니 죽어서도 닫을 수...
#배한봉
#시
#아침
#육탁
원문링크 : 시| 육탁 아침 배한봉시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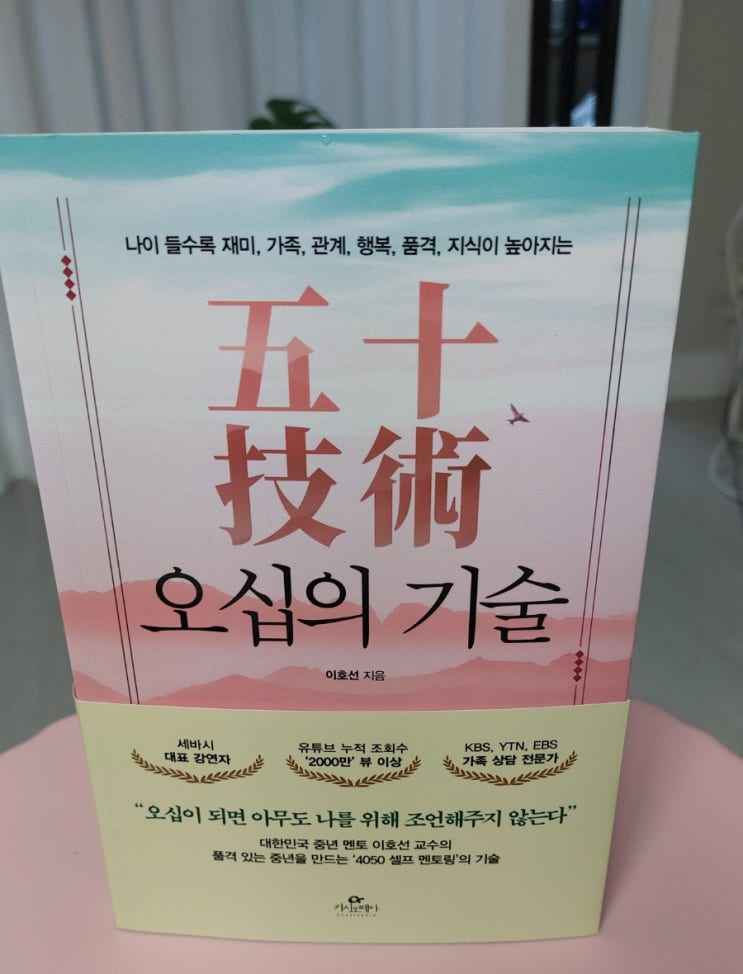




![[녹사평 이태원 카페] 경리단그집 경리단길 조용해서 쉬어가기 좋은 경리단 카페 커피 맛집](https://mblogthumb-phinf.pstatic.net/MjAyMzA4MDNfMTMw/MDAxNjkxMDIyNTQwNTg4.ohFqngfslqloLQeodDt7U_ExeNm_ItxjqRzBtdy5gv4g.4Yi_EiXC3remHpp6falmueTXP0ZQSaRPoyQYRpK1kn0g.JPEG.lsoyoung1015/20230731%A3%DF122818.jpg?type=w2)